
독립출판물, 에세이
체감, 윤안채영
뭐랄까? 홀릴 뻔했다고 해야되나? 뭔가 묘하면서도 엉뚱하고 기발한 내용으로 가득한 책. 지하철 계단에 떨어진 나뭇잎이 안타까워 낙엽을 구석에 몰래 세워두고, 브로콜리를 먹으면 몸 안에서 나무가 자랄 것 같아 먹지 않았다는 귀엽고 엉뚱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제목 : 체감
저자 : 윤안채영
펴낸곳 : 윤안채영
제본 형식 : 종이책 - 무선제본
쪽수 : 146쪽
크기 : 128x182mm
가격 : 12,000원
발행일 : 2022년 8월 15일
ISBN :
작가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unan_chae02/

코가 시리면 겨울,
정수리가 뜨거우면 어름.
마음이 시리고 머리는 뜨거운 나는
지금 어느 계절을 사는 것일까.

'에버랜드'가 처음 개장했을 때는 이름이 '자연농원'이었다고 한다.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아빠가 살아있는 역사 같았다. 어떠한 랜드마크의 시작을 함께한다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다. 나에게도 그런 곳이 있다. 노량진에서 용산으로 넘어가는 한강 다리 사이의 작은 섬, 노들섬. 그 길은 내 등하굣길이었다. 한강대교를 지날 때 항상 내 귀에는 새소년의 '난춘'이 들렸고, 내 눈은 아침 윤슬과 한강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노들섬을 만났다. 아무것도 없던 그 섬. 보이는 건 없지만 저곳은 나는 꽤 잘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노들섬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9월 초의 노들섬은 아주 따스했다. 흔들리는 갈댓잎 냄새는 고소했고, 가까이서 보는 윤슬은 찬란했다. 중간고사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이곳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감격스러웠다. 나는 그곳에 자주 갔다. 나는 노들섬의 사계절을 보았고, 그 곳의 모든 모습을 사랑했다. 강을 따라 돌면 내 안에 여유가 충만해졌고, 누구와 가느냐의 격차가 가장 크지 않은 곳이었다. 덜 친한 사람과 갔을 때는 더 가까워지고, 더 친한 사람도 더 가까워지는 마법. 걷는 것을...

한 날 아침 제법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보았다. 짧은 바람에도 꽃잎은 흔들렸다. 그 여린 것을 보고 마음이 나아졌다. 나비효과처럼 바람에 흔들린 꽃이 일으킨 바람은 멍든 내 어딘가를 후후 불어주었다. 다음 날은 비가 왔다. 여린 꽃잎이 전부 떨어져 버렸을 것 같아 속 이 상했다. 아침 길에 조심스럽게 벚나무를 찾았다. 꽃잎은 아직 붙어있었다. 내게 괜찮다는 듯이 빗방울에 맞춰 끄덕이고 있었다. 떨어진 꽃잎도 물론 있었지만, 빗방울을 튕겨내며 끝까지 나무를 지키는 꽃잎도 있었다. 나마저도 지켜졌다. 만물은 다들 약간의 모순점을 가지고 산다. 나 또한, 너 또한 말이다.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 는 노릇이다. 우린 그렇게 평면적이지 않은, 입체적인 삶을 꽃잎처럼 살아내고 있다. 다시 해가 나왔다. 떨어진 꽃잎들을 추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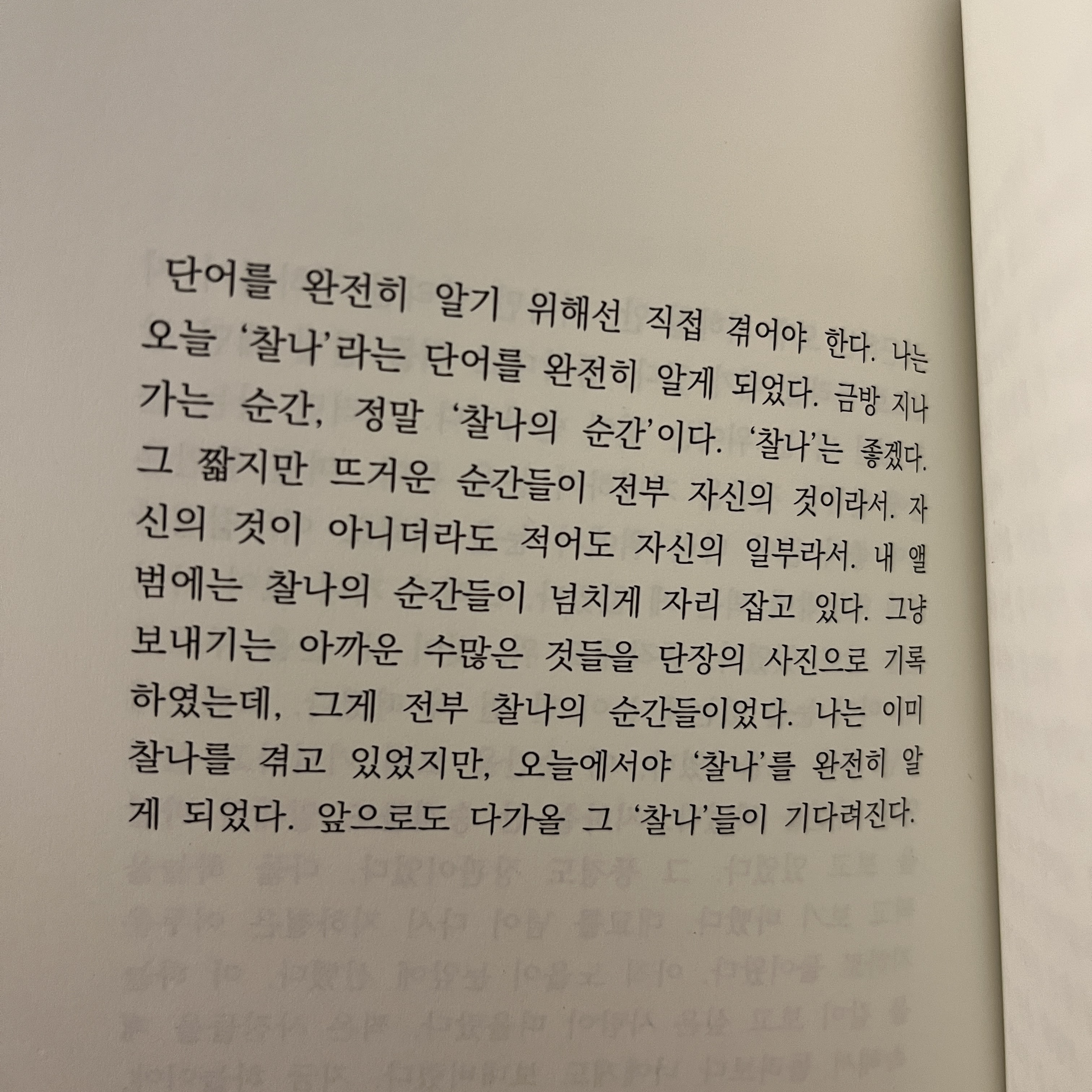
단어를 완전히 알기 위해선 직접 겪어야 한다. 나는 오늘 '찰나'라는 단어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금방 지나가는 순간, 정말 '찰나의 순간'이다. '찰나'는 좋겠다. 그 짧지만 뜨거운 순간들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서.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일부라서. 내 앨범에는 찰나의 순간들이 넘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냥 보내기는 아까운 수많은 것들을 단장의 사진으로 기록 하였는데, 그게 전부 찰나의 순간들이었다. 나는 이미 찰나를 겪고 있었지만, 오늘에서야 '찰나'를 완전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다가올 그 '찰나'들이 기다려진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 지하철역으로 몸을 숨기다가 계단에 힘없이 착륙한 나뭇잎을 보았다. 바람의 영향력은 나무 한 그루 없는 지하철역 안에 사뭇 이질적인 이파리를 데려다주는 정도구나. 바쁜 것들로만 가득 메워진 지하 공간에게 나뭇잎은 얼마나 여유롭고 가벼울까. 매번 높은 곳에서 흔들리다 내려간 나뭇잎은 지하 공간이 얼마나 후끈하고 단단할까. 하지만 결국 서로가 생경해 하기만 하다가 헤어지겠구나. 다시금 바쁜 사람 들에게 쏠리고 찢겨 각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겠지. 마른 나뭇잎을 주워 지하철 계단 구석에 몰래 세워 두 었다. 언젠가 발견될 테지만 최대한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깊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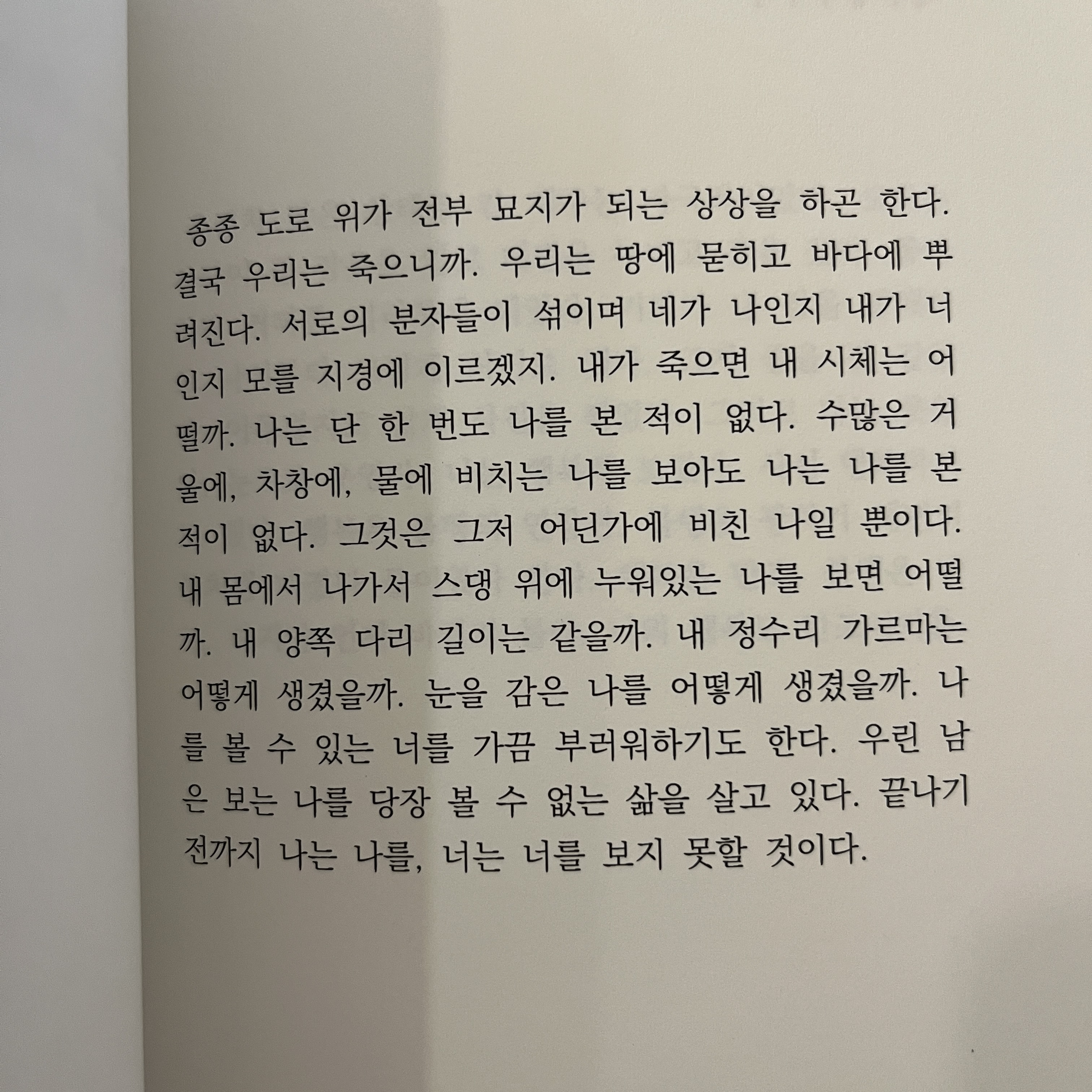
종종 도로 위가 전부 묘지가 되는 상상을 하곤 한다. 결국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는 땅에 묻히고 바다에 뿌려진다. 서로의 분자들이 섞이며 네가 나인지 내가 너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겠지. 내가 죽으면 내 시체는 어떨까. 나는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수많은 거울에, 차창에, 물에 비치는 나를 보아도 나는 나를 본 적이 없다. 그것은 그저 어딘가에 비친 나일 뿐이다. 내 몸에서 나가서 스댕 위에 누워있는 나를 보면 어떨 까. 내 양쪽 다리 길이는 같을까. 내 정수리 가르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눈을 감은 나를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볼 수 있는 너를 가끔 부러워하기도 한다. 우린 남은 보는 나를 당장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끝나기 전까지 나는 나를, 너는 너를 보지 못할 것이다.

편식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지만 그런데도 먹지 않는 음식이 있었다. 바로 브로콜리였다. 브로콜리는 작은 나무같이 생겨서 하나 먹으면 몸 안에 나무가 자랄까봐 겁이 났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억지로라도 먹으라 해서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 뽀글뽀글하게 생긴 부분이 혀에 닿는 느낌이 불쾌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안 먹는 것들을 딱히 강요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시큼한 초장에 푹 찍어 와그작 먹어버리는 아빠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긴했다.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나는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이 있다. 내가 잘 먹지 못하는 것을 잘 먹는 사람을 보면 멋지다. 나는 큰 음식을 못 먹는데 큰 김치를 한입에 먹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멋지다고 했던 적이 몇 번 있다) 엄마는 며칠 뒤에 브로콜리를 잘게 다져 주먹밥을 해주셨다. 브로콜리인지도 모르게 그 밥을 먹었다. 전혀 역하지 않았다. 그냥 주먹밥 맛이었다. 브로콜리가 몸 안에서 자랄 걱정도 없었다. 나는 그 브로콜리 주먹밥 이후로 브로콜리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는 브로콜리를 좋아하기까지 한다.
모든 것을 브로콜리처럼 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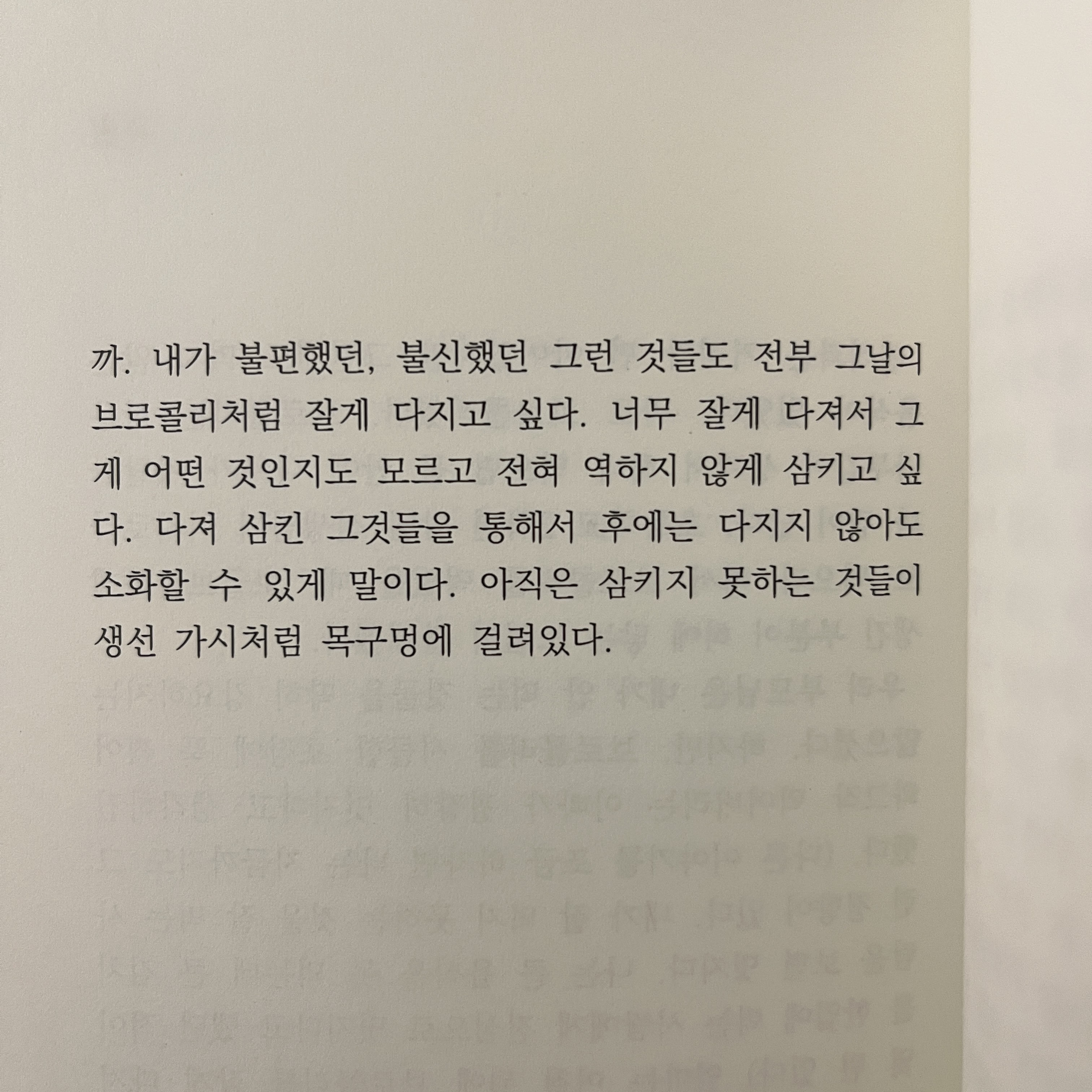
내가 불편했던, 불신했던 그런 것들도 전부 그날의 브로콜리처럼 잘게 다지고 싶다. 너무 잘게 다져서 그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전혀 역하지 않게 삼키고 싶다. 다져 삼킨 그것들을 통해서 후에는 다지지 않아도 소화할 수 있게 말이다. 아직은 삼키지 못하는 것들이 생선 가시처럼 목구멍에 걸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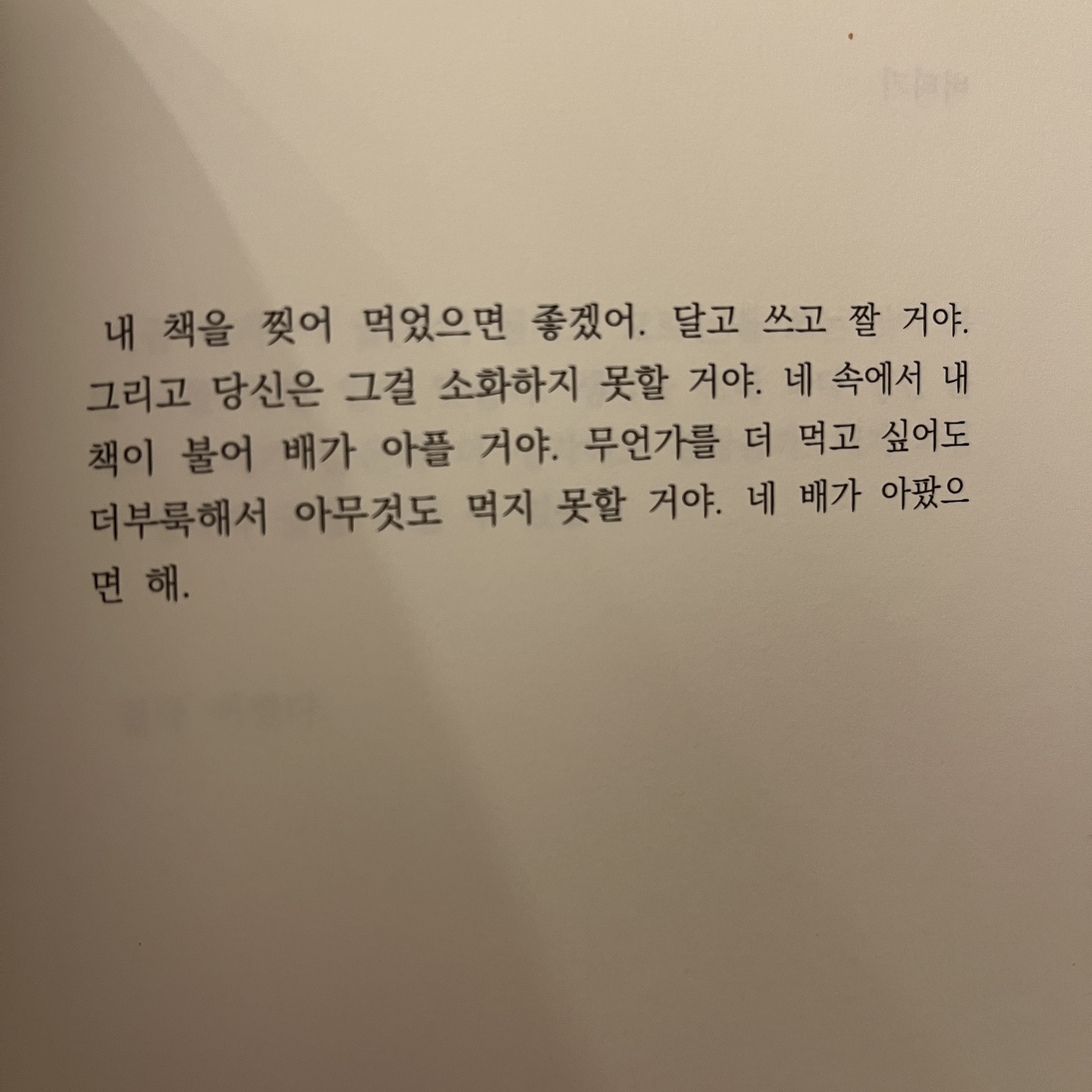
내 책을 찢어 먹었으면 좋겠어. 달고 쓰고 짤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걸 소화하지 못할 거야. 네 속에서 내 책이 불어 배가 아플 거야. 무언가를 더 먹고 싶어도 더부룩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거야. 네 배가 아팠으면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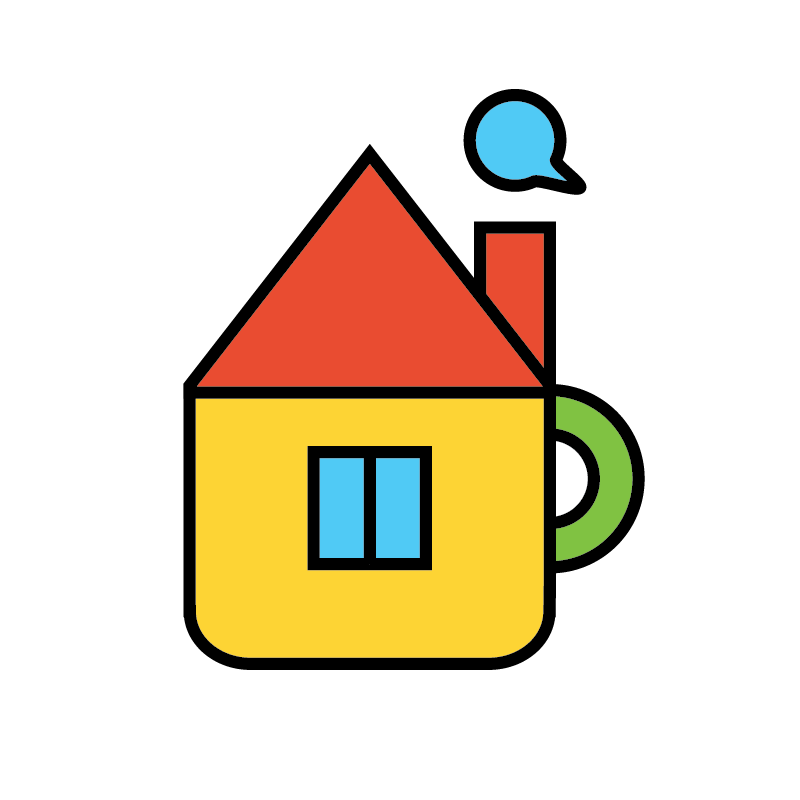
강다방 이야기공장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162 (옥천동 305-1)
이야기를 팝니다
강릉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독립서점, 헌책방, 출판사, 편지, 기념품 가게
'강다방 이야기공장 > 입점 도서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독립출판물, 시집] 머릿속에 블루스크린이 떴다, 이은별 (1) | 2023.04.08 |
|---|---|
| [독립출판물, 에세이] 싶싶한 하루 보내세요, 권민정 등 5명 (0) | 2023.03.27 |
| [독립출판물, 에세이 소설] 꽃이 온 마음, 조민경 (1) | 2023.03.25 |
| [독립출판물, 에세이] 나의 봄여름가을겨울은 얼마나 왔을까, 자영 (0) | 2023.03.18 |
| [독립출판물, 시집] 그대는 나의 사계절이에요, 이재남 (0) | 2023.03.14 |